 | ||
| ^^^▲ 구절초 ⓒ 이종찬^^^ | ||
마악 비음산에서 해가 떠오르는 이른 아침, 오스스한 한기를 느끼며 여닫이 방문을 열면 이내 방안으로 눈이 부시게 찬란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빛... 빛... 빛... 그 찬란한 빛살 너머 누더기옷을 입은 허수아비 몇 가슴팍에 세워두고 쓸쓸히 드러누운 빈 들판. 그래, 빛은 바로 저 들판에서 우리 집을 향해 일직선으로 꽂혀들고 있다.
수확을 마친 텅 빈 들판에 마치 싸락눈처럼 하얗게 내린 무서리가 앞산가새(앞산)에 널린 수정처럼 찬란한 빛을 내는 11월의 이른 아침. 이불을 끌어당겨 온몸을 감싸 안아도 오스스한 한기는 가시지 않는다. 그때 장닭이 양 날개를 "푸다다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오~오오~오" 하는 소리를 낸다. 그와 동시에 비음산에 반딧불처럼 빛을 내던 아침 해가 트림을 하듯 쑤욱 떠올랐다.
그래. 어젯밤 뒷마당에 천자봉처럼 높다랗게 쌓인 그 볏짚으로 군불을 땠었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저항이라도 하려는 듯이 10여 단이나 지폈었지. 평소에는 5단만 하면 될 것을. 에~에에취~ 이런 이런! 그 덕분에 온돌방이 너무 뜨거워 이불자락을 걷어차고 자다가 그만 감기에 걸린 모양이다.
수정 같이 빛나는 햇살이 무서리에 덮힌 마을을 서서히 깨우고 있다. 그래. 수정,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다. 우리들이 '앞산가새'라고 부르는 마을 앞산은 비만 많이 오면 군데군데 무너져 벌건 황토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산사태가 난 그 산벼락(산비탈)에는 수정이 많았다. 따개비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육각 반듯한 수정. 그 수정은 대부분 거울처럼 투명했다. 하지만 간혹 보랏빛을 띠는 아름다운 수정도 있었다. 우리는 그 보랏빛을 띠고 있는 그 수정을 발견하면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기까지 했다.
우리들은 그 보랏빛 수정을 다이아몬드 사촌 정도쯤 되는 줄로 알았다. 하지만 결국 그 다이아수정의 마지막 주인은 늘 가시나들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서로 다투기까지 하면서 차지한 그 다이아수정은 저마다 마음 깊숙히 점 찍어둔 그 가시나들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로 쓰였으니까. 마을 가시나들도 마을 머스마가 그 다이아수정을 주면 얼굴을 붉히며 제법 시치미를 떼는 척하다가 못이기는 척 슬그머니 받곤 했다.
"니~ 잠깐만 이리 와 볼래?"
"와?"
"오라카모(오라면) 퍼뜩 오면 될 일이지, 머스마가 머슨 토를 그리 많이 다노."
"가시나 그거 올(오늘) 따라 디기(꽤) 별시럽네(별스럽네)"
"가만, 니 쪼매마(조금만) 눈 좀 감고 있거라"
"가시나 니~ 내 놀리물라꼬(놀려먹으려고) 그라제?"
"머스마 그거, 가시나처럼 머슨(무슨) 겁이 그리 많노? 퍼뜩 눈이나 감아라카이"
"알았다. 자~ 인자(이제) 됐나?"
"니~ 눈 뜨모(뜨면) 안된다이~"
"알았다카이"
"아나~"
 | ||
| ^^^▲ 쑥부쟁이 ⓒ 이종찬^^^ | ||
갑자기 코끝에 향긋하게 묻어오는 꽃향기. 그와 동시에 까르르 숨 넘어가듯이 들리는 가시나의 웃음소리. 눈을 뜨면 이내 저만치서 가을햇살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노루처럼 힐끔힐끔 뒤돌아보며 달려가는 그 가시나의 모습. 그 가시나가 달려가는 시내 둑가에 점점이 피어있는 들국화 들국화 들국화...
그래, 그 아름다운 들국화 꽃다발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었다. 우리 마을 가시나와 머스마들이 그동안 점 찍어둔 그 가시나에게 다이아수정을 건네줘야만이 그 가시나가 고사리 손으로 꺾은 그 들국화 꽃다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점 찍어둔 그 가시나들한테 그 아름다운 들국화 꽃다발을 받고도 아무도 자랑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이아수정을 받은 그 가시나가 그랬던 것처럼.
당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 중의 비밀이 바로 머스마와 가시나가 단 둘이서 만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나 서로 무언가를 주고 받는 것이 행여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당시 말로 '골로 가는'(반쯤 죽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마을의 담벼락에 그 가시나와 머스마의 이름이 하트 표시와 함께 대문짝만하게 분필로 그려지는 것은 물론 몇 월 며칠에 누구누구랑 뭐뭐까지 했다며 마구 부풀렸기 때문이었다. 심한 때에는 학교 담벼락에까지 그 내용이 노랑색 분필로 마구 씌어져 있기도 했다.
"니한테 쪼메이(조금) 미안타."
"뭐가?"
"괜히 내 때문에 니까지 이름이 다 붙어서..."
"...괘안타. 그라고 이참에 니한테 이런 거 물어봐도 괘않을랑가 모르겄다."
"뭔데? 퍼뜩 말해 보거라"
"니 참말로 내 응응하나? 나는 니가..."
"가시나 이기 지금 뭐라카노?"
"...아아~ 아이다"
우리 마을에는 희귀한 야생초들도 많았지만 가을이 오면 들국화 또한 많이 피어났다. 당시 우리들이 들국화라고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들에 피어 있는 국화였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집 장독대 곁에서 탐스럽게 피어나던, 애기 얼굴 만한 노오란 그 국화가 아닌, 그 국화와 비슷하게 생긴 꽃이 들녘에서 피어나면 모두 들국화라고 불렀다. 그리고 들국화에서 나는 향기 또한 집에서 기르는 그 국화향과 꼭 같은 내음이 났다.
우리들이 부르는 들국화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 대부분 동그랗고 노오란 꽃술을 중심으로 꽃잎이 여러 개 달린 꽃이었으나 그 형태와 색깔이 약간씩 달랐다. 어떤 꽃은 꽃잎이 희면서 약간 살이 쪄 있었고, 또 어떤 꽃은 꽃잎이 빼빼 마르고 연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 집에서 기르는 그 국화처럼 생긴 노오란 꽃도 있었다. 하지만 봉오리가 형편없이 작았다. 또한 집에서 기르는 국화는 꽃술이 하나도 없이 꽃잎만 촘촘히 박혀 있었지만 이 꽃은 동그란 꽃술 주변으로 노오란 꽃잎이 촘촘히 달려 있었다.
뒤에 와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우리들이 들국화라고 싸잡아 부르던 그 꽃들은 모두 제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흰색 꽃잎을 달고 있었던 것은 구절초였고, 연보랏빛 꽃잎을 달고 있었던 것은 개미취였다. 그리고 노오란 꽃잎을 국화처럼 달고 있었던 것은 감국이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그 꽃들을 구절초, 개미취, 감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어릴 때처럼 그냥 싸잡아 들국화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러야 나도 모르게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내 어린 날의 고향, 그 고향에서 티끌 하나 없이 피어나던 그 들국화 같은 농촌 소년의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내 얼굴, 그 가시나와 나, 그 가시나들과 우리들의 아름다운 첫사랑, 끝내 짝사랑으로 끝나버린 첫사랑의 고운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기억 속으로 첨벙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니 뽀뽀 해봤나."
"응~ 내는 뽀뽀 많이 해봤다."
"진짜가?"
"진짜라카이."
"누구랑 몇 번이나 했는데?"
"그건 비밀이다."
"피이~ 큰소리 탕탕 칠 때 알아봤다카이."
"그라모 가시나 니는 너거 엄마캉 아빠캉 뽀뽀 안했나?"
"피이~ 내가 지금 그런 뽀뽀 말하는 줄 아나?"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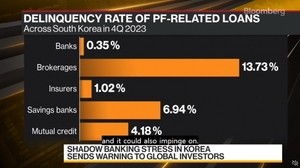


















![[특별대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유민주당 인천 서구병 이진기 예비후보](/news/photo/202403/600022_545770_3853.jpg)






![[긴급시국분석] 북한의 내년 4월 총선 전후 기습남침과 좌파들의 내란 및 전민봉기 철저히 대비하라!](/news/thumbnail/202312/592978_536686_4219_v1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