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김소월 '진달래꽃' 모두)
 | ||
| ^^^▲ 진달래꽃창꽃을 바라보면 그 가시나의 얼굴이 떠오른다 ⓒ 우리꽃 자생화^^^ | ||
"우리 나중에 소 먹이러 가는 길에 창꽃도 좀 따자"
"창꽃은 머슨 창꽃. 우리가 오데(어디) 가시나가, 창꽃을 따구로(따게)"
"내 말은 그기 아이고, 심심할 때 묵구로(먹게)"
"니 그라다가 개창꽃을 잘못 따 묵으모 우째 되는 줄 아나? 어르신들이 그라던데, 회초리 맞은 개구리처럼 뻗어가(뻗어가지고) 발발 떨다가 캑 하고 뒈진다카더라"
"됐다, 고마. 내가 개창꽃도 구분할 줄 모르는 얼핑이(바보)인 줄 아나"
그때 우리는 진달래꽃을 '창꽃'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진달래꽃이 마악 지기 시작할 때부터 피어나는, 그러니까 진달래꽃보다 더 색깔이 짙고 예쁘게 피어나는 철쭉을 '개창꽃' 이라고 불렀다. 하긴 내가 어른이 되어서 알게 된 일이기는 하지만 안동에서는 진달래꽃을 '참꽃'이라고 부른단다.
내가 자란 고향 마을을 둘러싼 산에는 창꽃이 유난히 많았다. 우리 마을 들판 곳곳에 마치 산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야트막한 산들 뿐만 아니라, 마디미(상남)를 둥지처럼 감싸고 있는 제법 높은 산마루에도 온통 창꽃이 발갛게 피어났다. 언뜻 바라보면 우뚝 선 산이 마치 시집을 가는 새색시처럼 연분홍 가리개를 포옥 덮어쓰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중에서도 앞산가새에 계단처럼 다닥다닥 붙은 다랑이 밭둑에서 피어나는 창꽃이 꽃송이가 크고 빛깔도 훨씬 고왔다. 당시 우리가 주로 따 먹었던 창꽃은 앞산가새 밭둑에서 피어나는 연분홍빛 고운 그 창꽃이었다. 창꽃은 입에 넣으면 향긋하면서도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났다.
"아! 퇘퇘퇘!"
"니 갑자기 창꽃을 묵다가 와 그라노? 벌거지(벌레) 묵은 이라도 뿌러졌뿟나?"
"으~ 그, 그기 아이고, 저기"
"저기 우쨌다 말고?"
그날, 앞산가새에서 한창 진달래꽃을 따먹던 내 친구가 내뱉은 것은 침이 묻어 더욱 진한 분홍빛을 띠고 있는, 마치 껌처럼 짓이겨진 창꽃이었다. 그런데 짓이겨진 그 창꽃에는 그 친구의 썩은 이처럼 거무스럼한 게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벌이었다.
내 친구는 창꽃 속에 벌이 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통째로 따서 입에 넣다가 그만 벌에게 혓바닥을 쏘이고 만 것이었다. 이내 내 친구의 혓바닥이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내 친구는 아예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데굴데굴 구르기 시작했다.
"아이구, 이거로 우짜것노? 이거로 우짜것노?"
"야가(이 아이가) 우짜다가 이랬노? 너거들은 퍼뜩 뛰어가서 차의사로 좀 불러온나. 벌한테 쎗바닥(혀)을 쏘였다카고"
"문디 자슥! 그라이 창꽃은 말라(뭐하러) 따묵노. 그기 배가 부르더나, 맛이 있더나"
그랬다. 그 친구 어머니의 말마따나 창꽃은 아무리 따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다. 또한 그리 맛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 군것질을 할 수가 없었던 우리들에게 창꽃을 따먹는 그 재미마저 없었다면, 밥만 먹고 돌아서면 이내 쪼르륵 거리던 배고픔을 어찌 감당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 혓바닥 벌침 사건(?)으로 인해 내 친구는 그해 그 향긋한 창꽃을 다시는 따먹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듬 해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창꽃을 한입씩 따먹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창꽃을 따먹을 때면 반드시 창꽃 속에 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뒤에 창꽃을 따먹었다. 그리고 으레 그 혓바닥 사건(?)을 들먹이며 배를 잡고 깔깔거렸다.
"니 퍼뜩 앞산가새에 가서 창꽃 좀 따온나"
"창꽃예? 창꽃은 따 가 뭐할라꼬예?"
"저녁에 너거들한테 맛있는 창꽃찌짐이(창꽃전)로 부쳐줄라꼬 안 그라나"
"예에? 알겠심니더. 퍼뜩 가서 창꽃을 한 소쿠리 따오께예. 그라모 나중에 창꽃찌짐이도 한소쿠리 부쳐 주이소"
 | ||
| ^^^▲ 진달래그 가시나의 발간 입술처럼 ⓒ 우리꽃 자생화^^^ | ||
해마다 창꽃이 필 때면 우리 마을 어머니들은 창꽃잎을 전 위에 올려놓고 예쁜 화전을 구웠다. 창꽃전은 보기에도 참으로 예뻤지만 입에 넣으면 향긋한 창꽃 내음이 감돌면서 미처 몇번 씹기도 전에 저절로 목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날은 보리가 더 많이 섞인 시커먼 밥을 두 그릇씩이나 뚝딱 비워냈다.
"니 두 눈 꼬옥 감아봐라"
"와? 오늘은 또 뭐로 내한테 줄라꼬 그리도 호들갑을 떠노?"
"머슨 머스마가 말이 그리도 많노. 우리 할매가 그라던데 머스마가 말이 많으모 가랭이가 찢어진다 캤다"
"......"
"자~ 인자 눈 뜨도 된다"
"이기 뭐꼬?"
그날, 그 가시나가 내게 한웅큼 내민 것은 금방 딴 싱싱한 창꽃이었다. 그 가시나의 상기된 볼처럼 연분홍빛을 곱게 띤 그 창꽃은 그냥 먹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다. 그래서 나는 그 창꽃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제법 책장이 두꺼운 지도책 갈피마다 예쁘게 끼웠다. 그리고 그 창꽃이 일년 내내 그 가시나의 고운 볼처럼 예쁘게 피어나기를 빌고 또 빌었다.
그래. 오늘도 문득 길을 걷다가 예쁘게 피어나고 있는 창꽃을 바라보면 그때 그 기억이 마치 현재처럼 또렷하게 떠오른다. 지금은 창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던 그 자리에는 반듯한 이층 주택이 빼곡히 들어찼지만, 그 주택가 곳곳에서도 마치 그때 그 기억처럼 예쁜 창꽃이 화분 속에 피어나 있는 것이 종종 보이기도 했다.
오늘도 발갛게 피어나는 창꽃을 바라보면 우물처럼 깊숙한 한쪽 눈동자를 찡긋하던 그 가시나의 눈빛이 슬며시 떠오른다. 하지만 그때 내게 창꽃 한웅큼 내밀던 그 가시나는 어디론가로 떠나고 없다. 아마도 그 가시나의 고운 마음씨처럼 멋진 신랑을 만나 창꽃처럼 예쁜 자식들을 낳았으리라.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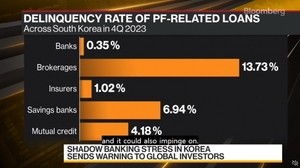




















![[특별대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유민주당 인천 서구병 이진기 예비후보](/news/photo/202403/600022_545770_3853.jpg)






![[긴급시국분석] 북한의 내년 4월 총선 전후 기습남침과 좌파들의 내란 및 전민봉기 철저히 대비하라!](/news/thumbnail/202312/592978_536686_4219_v1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