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그때는 도리깨로 보리타작을 했다 ⓒ 창원시^^^ | ||
새로 거른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옹헤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 낟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 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정약용의 '보리타작'에서)
오뉴월 뙤약볕은 검불이 이글거리는 아궁이속처럼 뜨거웠어. 마을사람들은 무논에 모내기를 끝내기가 무섭게 누렇게 익은 보리를 베기 시작했지. 보리베기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 허리가 부서져라 아픈 것은 둘 다 꼭 같았지.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 모내기를 할 때 가장 귀찮았던 것은 거머리였거든. 근데 보리베기를 할 때 가장 귀찮았던 것은 얼굴과 목, 팔, 다리를 따갑게 스치는 보리수염이었어.
그렇게 한동안 보리밭에 엎드려 보리를 열심히 베다가 허리를 쭈욱 펴기 위해 일어서면 노오란 별들이 수없이 떠올랐어. 몸이 허공에 붕 떠오르는 것처럼 어지러웠지. 그와 더불어 온몸이 따금거리며 가려워오기 시작했고.
"벌시로(벌써) 꾀가 살살 나는가베?"
"아입니더. 뭐가 바늘로 콕콕 쑤시는 거맨치로(것처럼) 온몸이 따갑고예, 지렁이가 기어가는 거맨치로 자꾸 근질거려서 그란다 아입니꺼."
"그래. 니 일어선 김에 퍼뜩 가서 썬한(시원한) 막걸리나 한 되 받아 오이라. 참이나 묵고 비자(베자)."
"돈은 예?"
"그냥 달라카모 알아서 줄끼다."
그래. 당시 우리 마을사람들은 대부분 마을에 꼭 하나 있는 구멍가게에서 외상을 달았어. 그 외상값은 보리타작이 끝나고 보리 수매를 한 뒤에 한꺼번에 갚곤 했고. 그리고 또다시 외상값을 갚은 그날부터 벼를 수확할 때까지 외상을 달았어. 구멍가게에서도 그런 일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올, 너거 논에서 보리로 베는가베, 하면서 빙그시 웃던 그 아주머니. 노오란 주전자에 막걸리를 담던 그 아주머니의 몸에서는 달착지근한 막걸리 내음이 나곤 했지. 그 아주머니는 꼭꼭 다지가(다져서) 한그슥(가득) 담아오라 캅디더, 라는 내 말에 그 녀석도 참! 하며 막걸리가 철철 넘치도록 담아주셨어.
"비가 오모 큰일인데…"
"아, 날씨가 이리 쨍쨍한데 갑자기 비 걱정은 머슨(무슨)."
"사람 마음맨치로 알 수 없는 기 날씨 아이더나."
"그라이 한 이틀 말리가(말려가지고) 퍼뜩 해 치우뿝시더."
 | ||
| ^^^▲ 누렇게 잘 익은 보리밭 ⓒ 이종찬^^^ | ||
보릿단을 깔고 앉은 아버지께서는 큰 사발에 막걸리를 철철 넘치도록 따르셨지. 그리고 입 한번 떼지 않고 순식간에 잔을 비웠어. 그때 아버지께서는 가끔 너거도 조금 마실래, 목이 탈 때는 막걸리가 최고 아이가, 하시며 우리들에게도 막걸리를 병아리 눈물만큼 쬐끔 부어주기도 하셨지.
그때 우리들은 아입니더, 아(아이)들이 우째 술로 묵을 낍니꺼, 하면서도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막걸리를 인상을 찡그려가며 마셨어. 그리고 삶은 감자를 안주처럼 한 입 베어물었지. 그랬어. 아버지의 말씀은 정말 맞았어.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렇게 탔던 목이 그때부터 마르지 않았어.
보리를 베다보면 간혹 뱀을 발견할 때도 있었지. 하지만 보리밭에 있는 뱀은 대부분 독이 없는 물뱀이었어. 우리들은 으레 지게작대기로 그 뱀을 들어 멀리 내던지곤 했지. 보리를 베다가 실수을 하여 손가락을 베이기도 했고. 하지만 보리밭은 베어도 베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어.
니도 털고 옹해야
나도 털고 옹헤야
잘도 턴다 옹헤야
어쩔시구 옹헤야
저쩔시구 옹헤야
빨리 털어 옹해야
수매 내고 옹헤야
외상 털자 옹헤야
어쩔시구 옹헤야
저쩔시구 옹헤야
내 도리깨 옹헤야
니 도리깨 옹헤야
잘도 치네 옹헤야
그렇게 힘겹게 보리를 벤 뒤, 사나흘 쯤 지나면 보리타작이 시작되었지. 당시 우리 마을에서는 대부분 도리깨로 보리타작을 했어. 보리타작은 먼저 보리밭에 커다란 덕석을 깔아놓고 그 위에 보리를 가지런히 깔아야 놓아야만 해. 그러고 나면 마을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보리이삭을 향해 도리깨로 두들기기 시작했지.
그때 부르는 노래가 옹헤야, 라는 노래였어. 그 노래는 주로 마을 아버지들이 니도 털고, 라며 선창을 했어. 그러면 마을 어머니들은 옹헤야, 하고 후창을 했고. 그때 나도 도리깨질을 첨 해봤어. 도리깨질은 정말 힘들었어. 또 도리깨를 잘못 돌리다가 도리깨에게 내 몸을 얻어맞기도 했지.
도리깨질은 보리이삭을 내려칠 때 힘을 집중해야만 했어. 또 그럴 때마다 타닥, 하는 소리와 함께 보리 이삭이 이리저리 튕겼고. 당시 도리깨질은 대부분 어른들이 했어. 우리들은 어른들이 보리타작을 하기 좋게 덕석 근처로 보리단을 끌어모으는 일을 주로 했어. 그리고 보리이삭을 주웠지.
내 어린 날의 보리타작은 그렇게 힘들게 했어. 하지만 어른들은 그 힘겨웠던 보리타작이 끝나기 무섭게 소를 몰고 나가 쟁기로 보리밭을 갈아엎었지. 그리고 갈아엎은 그 논에 물을 대고 써래질을 한 뒤 또다시 모내기를 했었어.
근데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어. 보리타작을 마친 논에는 누구나 들어가 보리이삭을 마음껏 주울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때 어떤 아이들은 보리이삭을 한 부대씩 줍기도 했어. 하지만 어른들은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 했지. 그 어려웠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아나!"
"그기 뭐꼬?"
"너거 논에서 주운 보리이삭이다."
"니가 주운 보리이삭을 와 내한테 주노?"
"울 옴마가 너무 많이 줏어왔다꼬 너거 집에 갖다 주라 카더라."
"택도 없는 소리. 보리이삭은 주운 사람이 임자라 안카더나. 그라고 내가 니한테 이거로 받아가모 혼난다. 앵금통 같은 넘이라꼬."
그래. 그 가시나 집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았어. 농사를 지을 논도 없었고. 그 가시나 아버지는 마산에 있는 무슨 공장에 다녔지. 그런 까닭에 그 가시나는 그 바쁜 농번기에도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 그 가시나의 얼굴이 우윳빛처럼 뽀얗게 피어났던 것도 아마 그 때문이었을 거야.
당시 나는 오뉴월 뙤약볕이 내리쬐는 들판에서 얼굴이 까맣게 그을렸어. 하지만 그 가시나는 동화책에 나오는 백설공주처럼 얼굴이 뽀얗게 빛났어. 그 때문에 나는 그 가시나 곁에 쉬이 다가설 수가 없었어. 이상하게 그 가시나 앞에만 서면 늘 미묘한 갈등이 일곤 했고. 하지만 처음 내게 말을 걸었던 건 바로 그 가시나였어.
"인자 보리타작 끝났제?"
"와?"
"니캉 내캉 가재 잡으로 가구로(가게)."
"가재로 잡아가(잡아가지고) 뭐 할라꼬?"
"고마, 집에서 키울라꼬."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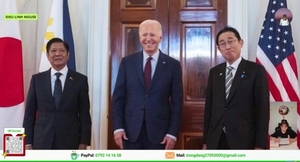



![[전문] 윤 대통령, 총선 참패의 원인](/news/thumbnail/202404/603535_550391_3114_v150.jpg)
![[인터뷰 ]수원특례시 김기정 의장,](/news/thumbnail/202404/603472_550319_5143_v150.jpg)













![[특별대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유민주당 인천 서구병 이진기 예비후보](/news/photo/202403/600022_545770_3853.jpg)






![[긴급시국분석] 북한의 내년 4월 총선 전후 기습남침과 좌파들의 내란 및 전민봉기 철저히 대비하라!](/news/thumbnail/202312/592978_536686_4219_v1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