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간.
김 PD는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고 있었다.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도 망가진 고환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하는 것이 급했다. 의사들은 김상수의 으깨진 고환을 꺼내고 피를 멈추게 응급조치했다. 그로써 일단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의사 생활 20년이 넘지만, 이런 환자는 처음이구만.”
“글쎄 말야. 온몸에 난 상처도 예사롭지가 않아. 저 정도로
구타를 당했으면서도 죽지 않은 게 용해.”
의사들은 수술용 장갑을 벗으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혹시…….”
“혹시 뭐?”
“깡패들에게 끌려가 테러를 당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기관에 끌려가…….”
“신경 쓸 거 없어.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저 사람을 살려내는 거라고.”
“하긴 그래.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심상찮아서 말야.”
“이 사람이, 신경 그만 쓰래도.”
김상수의 홀어머니와 누이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쥐고 제발 아들이 살아나기만을 빌고 또 빌었고, 누이는 연방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찍어냈다.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도 유분수지, 누이는 동생이 끔찍할 정도가 되어, 그것도 벌거벗겨 진 채로 집 앞에 버려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수술은 일단 성공적이었다.
김상수는 수술실에서 병실로 옮겨졌다. 그는 상체가 누더기처럼 상처가 났기 때문에 미라처럼 붕대로 감겨 있었다. 응급조치는 했지만 피가 배어나와 붕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놈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그랬어?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
“그래, 엄마 말이 맞다. 무엇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못 하게 하는 거니? 너 혹시 누구에게 잘못한 거 있니?”
어머니와 누이는 마취에서 깨어난 동생을 다그쳤다.
“글쎄 당분간 아무것도 묻지 말라니까요. 방송국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다는 것만 알리고, 어느 병원에 있다는 건 알려주지 마세요.”
김상수는 사타구니 전체가 빠져 달아나는 듯한 통증 때문에 얼굴을 잔뜩 찡그렸다.
누이가 말했다.
“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떤 놈들이 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만들었는지를.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너의 태도야.”
“이해 못 해도 별 수 없어. 제발 당분간만 날 내버려둬 달라고!”
김상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짜증이 났다. 가족들이 자신이 당한 일에 어처구니없어 하면서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 그렇게 난감할 수가 없었다. 정체도 모르는 놈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건드린 여자들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자신이 벌거벗기고 남자가 망가진 채 버려진 모습은 상상만 해도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웠다.
이제 앞으로 어떡한단 말인가.
무엇보다도 자신이 당한 일이, 남자를 상실했다는 소문이 방송국 참새 떼들에게 알려질까 봐 걱정이었다. 만약에 그렇게라도 되면,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동안 자신에게 당한 여자들이 얼마나 고소해할 것인가를 생각하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누이가 핸드백 속에서 봉투를 끄집어냈다.
“상수야. 더 이상 널 귀찮게 안 할 테니까 딱 한 가지만 묻자. 이건 뭐니?”
그것은 그의 목에 걸려있던 종이 장미였다.
“그게 뭔데?”
“모르겠어?”
“종이 장미 아냐?”
김상수는 별 걸 다 묻는다는 표정이었다.
누이는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아무래도 동생이, 자신의 목에 그것이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확실했다. 그렇다면 지금 망가진 제 몸 하나 추스르는 것도 힘든 동생에게 심적 부담까지 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 종이 장미를 왜 물어?”
“아, 아냐, 아무것도.”
누이는 종이 장미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다시 말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나중에 내가 설명해 줄테니까. 알았지? 누나가 가족들을 설득 좀 해주라고.”
“알았어. 우선 몸조리나 잘 해. 헌데 미국에 있는 오빠에겐 연락을 했는데 어떡하니?”
“뭐야! 형에게 연락을 했다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불 같은 형의 성격상 이 문제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었다. 한때 검찰에 근무한 경험까지 있는 형이고 보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 분명 했다. 검찰이나 경찰에 형이 아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었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어?”
“다 말했지. 네가 그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그냥 있니?”
“뭐하러 그랬어. 내가 알아서 해결하게 놔두지 않고는.”
“그래도 오빠는 알아야 할 거 아니니. 나중에 알면 그 불호
령을 어떻게 감당해. 너도 오빠 성격을 잘 알잖아.”
그것도 맞는 말이었다.
“아마 늦어도 내일 오후쯤에는 한국에 도착할 거야.”
그는 이미 엎지른 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도 못 견디게 고통스러운데 내일 일을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알았어. 지금은 피곤하니까 나 혼자 있게 해줘. 자고 싶어.”
옆에 있던 어머니도 그에게 뭔가를 말하려다 자고 싶다는 말에 입을 다물었다. 우선은 아들을 푹 쉬게 해주어야 할 것 같았다. 녀석의 몸을 보면 억장이 무너졌지만, 저렇게 막무가내로 입을 열려하지 않는다면 다그쳐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 한숨 푹 자거라.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어머니는 이불을 아들의 목까지 덮어주었다.
[계속]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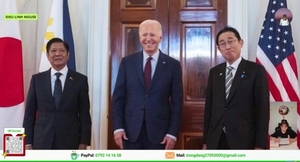



![[인터뷰 ]수원특례시 김기정 의장,](/news/thumbnail/202404/603472_550319_5143_v150.jpg)











![[기획]시흥의 매력을 품은 관광지 '살뜰하게 즐길 수 있는 시티투어' 운영](/news/thumbnail/202404/603352_550147_012_v150.jpg)


![[특별대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유민주당 인천 서구병 이진기 예비후보](/news/photo/202403/600022_545770_3853.jpg)






![[긴급시국분석] 북한의 내년 4월 총선 전후 기습남침과 좌파들의 내란 및 전민봉기 철저히 대비하라!](/news/thumbnail/202312/592978_536686_4219_v1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