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미루나무 ⓒ 산림청^^^ | ||
"미루~나무 꼭대~기에 조각~ 구~름 걸려 있네~"
우리 마을 곳곳에는 전봇대처럼 훌쭉하게 키가 큰 미루나무가 많았다. 특히 시월이 되면 마을 곳곳에 장대처럼 치솟은 그 미루나무에서 노오란 잎사귀가 마치 금잎처럼 투둑, 투두둑, 떨어져 내렸다. 그 노오란 미루나무 잎사귀가 쌓인 쥐빛 초가지붕과 골목길 곳곳은 마치 금으로 장식한 것처럼 환하게 빛이 났다.
"허어~ 참! 올해는 디기 벨 시럽네(특별하네)."
"내 참! 또 뭐가 그마이(그만큼) 벨 시럽다 카노?"
"뻐드나무 이파리 좀 봐라카이. 올개(올해)는 벨시리 노랗게 잘 물들었다 아이가."
"와? 또 집 나간 니 딸네미(딸) 생각이 나나?"
"아~ 아이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미루나무를 '뻐드나무' 라고 불렀다. 당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남천에 바람 난 처녀의 허리처럼 휘어지는 수양버들을 '버들나무' 라고 불렀고, 미루나무를 뻐드나무라고 불렀다.
그래, 그 뻐드나무... 해마다 시월이 오면 우리 마을은 그 뻐드나무가 떨구는 노오란 이파리 속에서 온통 금빛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우리 마을을 금빛 동화나라로 만들었던 것은 그 뻐드나무뿐만은 아니었다.
마을 앞으로 지평선처럼 드넓게 펼쳐진 들판도 노오란 금빛이었다.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영근이 아저씨 집 앞에 큰산처럼 웅크리고 앉은 백 년 넘은 은행나무도 진종일 금빛 잎사귀를 비처럼 떨구었다.
은행나무... 그래, 그 얄궂은 영근이 아저씨의 심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은행이 열리지 않았던 그 은행나무, 그 은행나무는 암놈인데도 이상하게 은행이 열리지 않았다. 간혹 오뉴월에 은행 몇 개가 달려도 가을이 채 오기도 전에 이미 다 떨어져 버렸다.^
은행도 달리지 않았던 그 은행나무가 떨구는 금비도 맞을 만했다. 하지만 마을 아이들은 아무도 그 은행나무 근처로 가지 않았다. 그렇찮아도 마을에서 심술궂기로 소문이 난 그 영근이 아저씨한테 무슨 날벼락을 맞을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 은행나무와 뻐드나무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는 식, 그러니까 마치 내기를 하듯 마을 곳곳에 그 노오란 금비를 마구 흩뿌렸다.
우리는 그 노오란 금비를 맞을 때마다 노오란 현기증이 일어났다. 마치 보릿고개가 낀 오뉴월, 앉았다 일어서기만 하면 노오란 별들이 한 무더기씩 떠오르던 그때처럼.
우리는 뻐드나무 아래 메뚜기처럼 오골오골 모여 하늘 높이 치솟은 그 뻐드나무를 목이 아프도록 바라보며 온몸에 금비를 맞았다.
그 은행나무도 뒤질세라 수없이 많은 금비를 흩뿌렸지만 뻐드나무가 떨구는 그 금빛 소나기에는 당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그 은행나무가 떨구는 은행잎이 금빛 가랑비라고 한다면 뻐드나무가 떨구는 노오란 잎사귀는 금빛 소나기였기 때문이었다.
또 그 은행나무는 우리 마을에서 꼭 한 그루뿐이었다. 하지만 뻐드나무는 마을뿐만 아니라 들판과 앞산 곳곳에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가까운 비음산에 올라가 산마루에서 남면벌을 바라보면 전봇대처럼 쭉쭉 뻗은 노오란 버드나무가 곳곳에 솟아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을이었다.
사람들은 가을날 노랗게 물든 잎사귀, 하면 누구나 은행잎을 쉬이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은행잎은 뻐드나무가 흩뿌리는 그 노오란 금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특히 새파란 하늘을 노랗게 가리며 금빛 새떼처럼 날아 내리는 그 금빛 깃털, 그리고 가을 햇살에 노오란 빛을 새파란 허공에 반짝거리며 하늘거리는 그 금빛 날갯짓하며...
지금은 그 뻐드나무가 있던 자리에 아파트가 빼곡이 들어차 있고,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줄지어 심어져 있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가을, 그리고 단풍, 하면 우리는 노오란 은행나무 잎사귀보다 먼저 뻐드나무의 그 노오란 잎사귀를 떠올렸다.
또 노오란 뻐드나무 잎사귀 중 상처가 없는 고운 것은 주워서 책갈피로 이용했다. 그리고 잎사귀가 넓적한 것은 가스나들이 주워 모아 편지지로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머스마들은 아무도 그 노오란 잎사귀 편지를 받아보지 못했다. 그 노오란 잎사귀 편지는 주로 가스나들이 머스마 몰래 사용하는 일종의 비밀편지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가스나들이 주로 속내를 털어놓고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일 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둥, 내가 그 머스마를 좋아하는데 그 머스마가 너무 무뚝뚝하다는 둥, 하는 그런 내용을 보낼 때 그 노오란 뻐드나무 편지지를 사용했다.
"우짜꼬?
나는 니가 좋다카이.
니는 내가 싫나?
아이제?
니도 날 좋아하제?"
당시 마을 어르신들의 말마따나 하늘 똥구멍을 찌를 만큼 그렇게 눈 시려운 허공을 찌르며 끝도 없이 쭉쭉 뻗어 올라간 뻐드나무... 우리는 따가운 가을 햇살을 손으로 가리며 목이 아프도록,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그 뻐드나무를 바라보았다. 오래 오래.
그리고 그 뻐드나무처럼 우리들의 키와 몸과 마음이 하늘로 쭉쭉 뻗어오르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우리들의 다부진 꿈도 그 뻐드나무와 함께 쭉쭉 키워나갔다.
늘 덕지덕지 실로 꿰맨 그런 누더기 같은 옷이 아닌 깨끗한 옷을 입고, 반찬이 없더라도 무시보리밥(무보리밥)이나 고매보리밥(고구마보리밥)이 아닌 늘 하얀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가끔 맛있는 자장면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꿈.
그래.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그곳에 가고 싶다. 그래, 지금도 30여년 전의 내 고향에서는 그 키 큰 뻐드나무가 그 노오란 금비를 투둑! 투두둑! 흘리고 있을 것이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집 나간 딸을 기다리는 그 어르신의 굵은 눈물처럼 그렇게, 오늘처럼 바람이 불면 황금빛 새떼가 되어 따가운 가을햇살에 노오란 금빛을 뿌리며 그렇게.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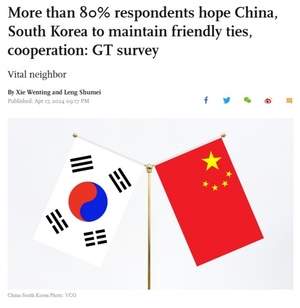






















![[특별대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유민주당 인천 서구병 이진기 예비후보](/news/photo/202403/600022_545770_3853.jpg)






![[긴급시국분석] 북한의 내년 4월 총선 전후 기습남침과 좌파들의 내란 및 전민봉기 철저히 대비하라!](/news/thumbnail/202312/592978_536686_4219_v1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