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물총새 ⓒ 창원시^^^ | ||
"기억 나나?"
"뭐가?"
"그 새 말이야. 우리가 쪼깬을 적에 무지개 새라고 부르던 바로 그 새?"
"무지개 새라이? 그런 새도 있었나?"
"으이그, 이 문디 손! 꼭 그 징글징글한 이야기를 해야 알것나? 킥킥킥! 미친 년 가랑이 속처럼 뻥 뚫린 그 구멍… 니가 그때 그 구멍에 손을 넣었다가 니 손가락으로 배암을 낚은 거… 킥킥! 아직도 잘 모르것나?"
"……"
그래, 생각 난다. 내 고향의 마을을 실뱀처럼 휘돌아 내려가는 얼음 같이 투명한 물살…그 물살을 차고 푸르디 푸른 하늘로 한껏 날아오르던 무지개빛 그 새. 그 새의 발톱 사이로 알알이 부서져 내리던 오색 영롱한 햇살, 햇살들…그래. 그 새, 우리들 어린 날의 꿈을 실어 나르던 그 새가 바로 물총새였지.
내가 태어난 곳은 경남 창원군 상남면 동산부락이다. 창원에서도 상남면은 4일마다 한번씩, 그러니까 4자와 9자가 붙은 날이면 반드시 큰 장이 섰고, 국민학교(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까지 있었다. 인근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이 학교를 다녔고, 장이 서는 날이면 면 안이 마치 잔치가 벌어진 듯 시끌벅적했다. 말하자면 창원에서도 제법 중심지에 속했던 곳이다.
내가 자란 동산부락은 동쪽에 우뚝 솟은 비음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남천으로 휘돌아 내리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6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던 마을은 마치 푸른 논 사이에 떠 있는 작은 섬과 같았다. 또한 마을 앞을 흘러 내리는 시내에 나가 돌멩이를 들추면 흔히 보이는 게 가재와 새우였다. 그도 그럴 것이 비음산 아래로 흘러 내리는 이 시냇물 주변에 있는 마을은 우리 마을이 첫 마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맑았을 수밖에.
그 얼음처럼 차디 찬 물가에는 소금쟁이를 비롯한 물방개, 장수잠자리, 물뱀, 자라, 뱀장어 등을 비롯한 온갖 곤충들과 물고기들이 살았고, 마을 주변에는 물총새, 뜸부기, 뻐꾸기, 소쩍새, 부엉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새가 살았다. 별로 가지고 놀 게 없었던, 아니 그것은 차라리 행복한 꿈이었는지도 몰랐다. 당시 우리들은 누구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파하면 농삿일을 거들어야만 했다. 그렇게 살면서 너무나 익숙하게 친해진 놀이감 같은 것이 그 곤충과 그 물고기와 그 새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총알처럼 물 속으로 파고 들어가 순식간에 물고기 한 마리를 물어 푸르른 하늘로 날아오르는 물총새는 우리들 희망의 상징이었다. 또한 물총새의 그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깃털은 부의 상징이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꿈꾸던 우리들은 누구나 물총새의 무지개빛을 동경했고, 또 커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래,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물총새를 잡으려 안간 힘을 다했는지도 모른다.
 | ||
| ^^^▲ 물총새 ⓒ 창원시^^^ | ||
당시 우리 마을 주변에는 야산이 많았다. 또한 야산 곳곳에는 산사태로 허물어져 벌건 황토를 드러낸 곳이 많았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서 살고 있는 물총새는 그런, 그 시뻘건 황토벽에 구멍을 내어 집을 짓고 알을 낳았다. 우리는 그 구멍을 발견하면 마치 무슨 보물이나 발견한 듯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그 구멍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물총새를, 그 무지개빛 꿈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엄연히 순서가 있었다. 제일 먼저 누가 발견했든지간에 우선 가위 바위 보를 했다. 그리고 꼴찌가 물총새의 집 속으로 긴 나무 막대기를 넣어 살살 흔들었다. 간혹 물총새의 집에는 우리가 채 발견하기도 전에 선수를 친 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뱀의 유무를 확인한 다음, 골찌 다음 사람이 물총새의 집에 손을 집어 넣어 알인지 새끼인지를 구분한 뒤, 새끼라면 끄집어내어 제일 이긴 순서대로 분배하고, 알이라면 부화할 때까지 그냥 두고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만 일이 터지고 말았던 것이다. 분명 물총새가 파놓은 구멍 속으로 긴 막대기를 휘휘 저어 뱀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구멍 속으로 손을 쑤욱 집어 넣었다. 물총새 알이 잡히거나 아니면 조그만 새끼가 잡힐 거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근데 무언가 따끔하면서 손바닥과 손목을 칭칭 휘어 감는 것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나무 뿌리인줄 알았다. 근데 이상했다. 후다닥 놀라 손을 뺐다. 아니나 다를까, 으아아아… 내 손사레에 저만치 떨어져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바로 물뱀이었다.
그랬다. 또 그렇게 집으로 가지고 온 물총새의 새끼는 맛있는 미꾸라지를 아무리 잡아 먹여도 대부분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꼭 한번 물총새 기르기에 성공한 적이 있었다. 나의 끝없는 정성 탓이었는지 그 물총새는 아주 잘 자랐다. 물총새가 제법 무지개빛을 띄면서 어른스러워질 무렵, 나의 정성도 더없이 물총새에게로만 쏟아졌고, 이제는 내 꿈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런데 그 꿈이 채 익기도 전에 그만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었다. 그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먹이를 주려고 뒷뜰에 갔던 나는 그만 경악하고 말았다. 미꾸라지통이 엎어진 것과 동시에 미꾸라지와 물총새가 하룻밤새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마악 녹색빛이 감도는 털 몇 점만 남긴 채. 그렇게 내 어린 날의 꿈은 뒷뜰에 말라붙은 미꾸라지의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렸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쥐 아니면 족제비의 장난이 분명하긴 했지만.
하지만 지금 그 부락은 온데 간데 없다. 어린 날의 내 추억이 숨쉬던, 내 푸르른 꿈이 자라던 그 자리에는 25층 높이의 아파트와 대형백화점이 자리잡고 있을 뿐이다. 또 한 가지 쓸쓸한 일은 그 아파트 속에는 그 예전에 물총새를 잡던 우리 고향의 내 소꿉친구들 일부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 백화점 속에는 나의 사랑스런 아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옷가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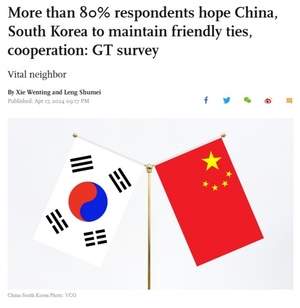






















![[특별대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유민주당 인천 서구병 이진기 예비후보](/news/photo/202403/600022_545770_3853.jpg)






![[긴급시국분석] 북한의 내년 4월 총선 전후 기습남침과 좌파들의 내란 및 전민봉기 철저히 대비하라!](/news/thumbnail/202312/592978_536686_4219_v1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