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모내기..모야 모야 우리 모야 ⓒ 창원시^^^ | ||
"저기 중참 온다. 퍼뜩 숭구고(심고) 중참 묵자. 어이~"
"저기 본동때기(본동댁) 동작 좀 보소. 에라이, 내도 모르것다. 어이~"
"에고! 숨 좀 쉬자, 숨!"
"최산요. 이기 뭐하는 짓인교? 참도 좋지마는 참말로 너무 하네."
"아, 그라모 손톱만큼 남은 이거로 남가고(남겨두고) 참을 묵을라 캤능교?"
"본동때기 니는 말라꼬(뭐할려고) 성(화)을 내쌓노? 이기 오데 니 논이가."
"그래 두대때기 말이 맞다. 못줄로 저리 급히 탱가모(넘기면) 대충 대충 심으모 될 끼 아이가."
모를 심고 있는 들판 곳곳에는 누릇누릇 익어가는 보리밭이 마치 섬처럼 떠 있다.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보리이삭이 까끌한 긴 수염을 마구 흔들거리고 있다. 문득 보리이삭이 모내기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이는 것만 같다. '앗 따까. 어서 날 좀 꺼내 줘.'
해마다 모심기가 시작되면 우리 마을은 장닭이 홰를 치며 '꼬끼오'하고 울기 전부터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깨우는 소리, 모를 찌기 위해 바삐 모판으로 향하는 마을 어머니들의 바쁜 발자국 소리, 모심기에 필요한 농기구를 챙기는 마을 어르신들의 헛기침 소리.
그와 더불어 희미한 호롱불이 일렁거리는 부엌에서는 끝없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쥐인가? 아니. 그 소리는 어머니께서 모꾼들의 아침식사를 준비하면서 내는 소리였다. 물단지에 물을 붓는 소리, 쌀을 씻는 소리, 솥뚜껑이 열리는 소리, 나뭇가지가 타닥타닥 타는 소리, 무언가를 자르고 두드리는 소리.
"야(얘)들아! 퍼뜩 안 일어나고 뭐하노? 올(오늘)은 우리 집 논에 모를 숭구는(심는) 날이라 안 카더나? 퍼뜩 일나서(일어나서) 소죽부터 퍼주고 모판에 가거라."
"......"
"야들이요. 뭐하노? 퍼뜩 안 일나고."
"조깨마(조금만) 더 자고예."
"너거 아부지 알모 불벼락 떨어진다카이."
부엌에서 달콤한 밥 익는 내음이 콧구멍을 솔솔 파고들었다. 하지만 밖은 아직도 어둑어둑했다. 해마다 우리 집에서 모내기를 하는 날에는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야만 했다. 학교에 가기 전에 모판에 나가 마을 어머니들이 한 묶음씩 쪄 놓은 모단을 날라야 했기 때문이었다.
"쟈(쨰)가 누고(누구야)? 장골(어른)이 다 되었뿟네."
"저 집 셋째 아이가. 그래도 저 집 아(아이)들은 울매나(얼마나) 부지런노. 오늘 저거 집에 모로 심는다꼬 핵교 가기 전에 논에 나온 거 좀 봐라."
 | ||
| ^^^▲ 모판 ⓒ 이종찬^^^ | ||
그렇게 하품을 째지게 하면서 신작로에 있는 모판에 나가보면 마을 어머니들은 벌써 모판 중간쯤에서 모를 찌고 있었다. 그러나 모를 많이 찐 데 비해서 모단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미 아버지께서 지게에 모단을 지고 모를 심을 논 여기 저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던져놓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들은 한줌에 모단을 3-4개씩 양손에 거머쥐고 모단을 날랐다. 우리들의 모단 나르기는 찐 모단을 논둑까지 옮기는 일이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모단을 지게에 지고 논 여기 저기에 모단을 던졌다. 또한 건져낼 모단이 없으면, 우리 형제들도 마을 어머니처럼 모판에 엎드려 모를 찌기도 했다.
하지만 모를 찌는 일은 그리 쉽지가 않았다. 자칫 잘못하면 모 밑둥만 뜯겨져 나오는 때가 많았다. 모를 찔 때는 두어 개의 모 밑둥을 잡고 뒤로 슬쩍 밀었다가 앞으로 당기듯이 가볍게 당겨야 했다. 또한 모단을 묶을 때도 일정한 크기로 묶어야 했다. 모 찌기도 공부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퍼뜩 날으거라. 벌써 해가 뜰라칸다."
"그래. 너거들 앞에 있는 그거만 건져내고 퍼뜩 집에 가거라. 지각할라."
이윽고 비음산에서 해가 뜨고, 교복을 입은 형님과 누나들이 하나 둘씩 보이면 우리들이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때면 우리들은 서둘러 도랑에 나가 논흙으로 범벅이 된 옷을 대충 씻고 세수를 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엉덩이만 슬쩍 걸친 채 서둘러 밥을 먹고 학교로 향했다.
"핵교 마치는 대로 철둑 밑에 있는 논으로 온나."
"오늘 중참이 뭔데예?"
"너거들이 좋아하는 국시(국수) 아이가"
"두 그릇 묵어도 되지예?"
"하모(응). 그거로 말이라꼬 하나."
지금은 대부분 이양기로 모를 심지만 그 당시에는 손으로 모를 심었다. 모를 심을 때는 마을 아버지들이 이쪽과 저쪽 논둑에 서서 못줄을 잡았다. 그러면 마을 어머니들은 못줄에 매달린 빨간 혹은 파란 표시를 보며, 논바닥에 엎드려 모를 심었다. 마을 아버지들은 모가 거의 다 심어질 때면 어이, 하면서 못줄을 들었다.
그리고 저쪽 논둑에서도 어이, 하는 소리에 맞추어 일정한 넓이로 다시 못줄을 친 뒤, 못줄이 감긴 지게 작대기를 물꼬에 단단하게 꽂았다. 그렇게 한동안 모를 심다 보면 마을 어머니들의 입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올 때도 있었다.
왜냐하면 못줄을 잡은 마을 아버지들이, 모를 심는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고 생각되면 마을 어머니들이 미처 모를 다 심기도 전에 다시 '어이'하면서 못줄을 다음 칸으로 넘겨버리기 때문이었다. 또한 마을 아버지들은 마을 어머니들이 힘에 자꾸 부친다는 생각이 들면 모내기 노래를 불렀다.
모야 모야 우리 모야
잘도 꽂네 우리 모야
모야 모야 우리 모야
요도 꽂고 저도 꽂고
잘도 꽂네 우리 모야
모내기 노래는 먼저 마을 어머니들이 "모야 모야 우리 모야" 하면, 마을 아버지들은 잘도 꽂네 우리 모야, 하면서 되받았다. 그러면 이내 그 힘들던 못자리가 온통 웃음바다로 변했다. 모내기 노래는 장단지까지 푹푹 빠지는 모판에서 모를 심는 마을 어머니들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했다.
또한 모내기 노래가 시작되면 참이 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모내기 노래 사이사이 마을 아버지들이 못줄을 넘기면서 내는 소리였다. '어이~'하는 그 소리는 마치 판소리를 할 때 중간 중간에 툭툭 쳐주는 북소리처럼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모를 심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종아리에 달라붙어 피를 빠는 거머리도 거머리였지만 무엇보다도 허리가 무척 많이 아팠다. 그래서 마을 어머니들은 '어이' 소리와 함께 못줄이 넘어갈 때마다 '우리 모야'하면서 허리를 쭈욱 폈다. 그리고 힐끔힐끔 신작로를 바라보며 중참이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렸다.
모야 모야 우리 모야
니도 꽂고 빨리 꽂고
나도 꽂고 빨리 꽂고
잘도 꽂네 우리 모야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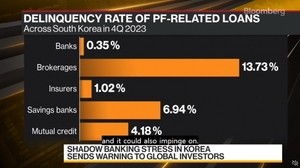






















![[특별대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유민주당 인천 서구병 이진기 예비후보](/news/photo/202403/600022_545770_3853.jpg)






![[긴급시국분석] 북한의 내년 4월 총선 전후 기습남침과 좌파들의 내란 및 전민봉기 철저히 대비하라!](/news/thumbnail/202312/592978_536686_4219_v1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