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기 꽁알 아니가 ⓒ 우리꽃 자생화^^^ | ||
"가만! 꽁알만 주울 끼 아이라 아예 암꽁(암꿩)까지 잡아뿌야 안 되것나?"
"에이! 그라지 말고 그냥 꽁알만 주워가자."
"와?"
"불쌍타 아이가. 그라고 꽁 생각도 좀 해주야 안 되것나. 꽁 입장에서 보모 꽁알 뺏기는 것도 성(부아)이 머리 끝까지 날 낀데, 지까지 잡히모 울매나 억울하것노."
"뭐라카노? 니는 시방 우리가 굶어죽을 판에 꽁 편을 드는 기가?"
"그기 아이고, 저 암꽁을 살려나야 또 꽁알을 낳을 꺼 아이가."
우리 마을을 가로질러 마치 자로 잰 듯이 일직선으로 쭈욱 뻗어 있는 신작로 주변은 온통 밀밭과 보리밭이었다. 그래. 신작로 주변을 파랗게 물들이고 있던 밀과 보리가 누릇누릇 익어갈 때면 부모님은 보리밭 한 귀퉁이에 있는 모판에 엎드려, 여린 잎사귀에 하얀 줄이 그어져 있는 피를 뽑느라 정신이 없었다.
우리 마을 신작로 주변에 심겨진 보리는 두 종류였다. 하나는 어르신들이 겉보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리서리를 해 먹을 수 없는 그런 보리였고, 다른 하나는 보리를 따서 수염을 떼낸 뒤 손바닥으로 비비면 금새 새파랗게 살찐 보리알갱이가 툭 툭 불거져 나오는 쌀보리였다.
 | ||
| ^^^▲ 토실토실 보리알이 차오르는 보리밭 ⓒ 이종찬^^^ | ||
그 당시 우리들이 까투리처럼 보리밭으로 살금살금 기어 들어가 한아름씩 베어내, 기찻길 주변에서 불에 그을려 먹었던 것은 주로 밀과 쌀보리였다. 아, 잠깐! 밀서리와 보리서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그만 접기로 하자. 이에 대해서는 김규환 기자가 이미 썼다.
그래.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소가 좋아하는 풀이 많이 자라고 있었던 그 들판의 논두렁은 마치 이발을 해 놓은 듯 반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 아이들이 매일 같이 그 논두렁에서 소풀을 베 낸 까닭이었다. 다시 논두렁에서 소풀이 그만큼 자라려면 이 주일 남짓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
그때 쯤이면 우리들은 대부분 밀밭과 보리밭에 들어가 소풀을 벴다. 밀이삭과 보리이삭이 제법 누르스럼하게 익어가는 그 밭 고랑에는 마악 꽃대를 올리는, 그때까지는 아직 줄기가 덜 억센 뚝새풀이 많았다. 하지만 밭 고랑에 빼곡히 자라고 있는 뚝새풀을 벨 때는 조심을 해야 했다. 자칫 낫질을 잘못하면 뚝새풀과 함께 밀과 보리를 베기 일쑤였기 때문이었다.
"푸더더덕"
"오메야! 휴우~ 저 꽁 때문에 간 떨어질 뿐 했네."
"어! 저기 뭐꼬? 꽁알 아이가. 어젯밤 무지개가 뜨는 꿈을 꿨더마는 올(오늘) 바로 횡재 맞았뿟네."
"우와! 꽁알이 도대체 몇 개나 되노? 아홉 개나 되네. 내도 몇 개 주라."
"택도 없는 소리!"
 | ||
| ^^^▲ 뚝새풀 ⓒ 우리꽃 자생화^^^ | ||
당시 우리 마을 아이들은 누구나 꿩을 '꽁'이라고 불렀다. 뚝새풀이 빼곡히 들어찬 그 밀밭과 보리밭에는 꿩 둥지가 제법 많았다. 간혹 재수가 좋은 날에는 소풀을 베다가 꿩 둥지를 두 개나 발견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꿩알도 꿩알 나름이었다. 어떤 때에는 꿩알을 발견해도 그대로 두어야만 했다. 마악 부화를 마악 앞두고 있는 그런 꿩알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끼! 이 문디 자슥아. 소풀은 안 베고 꽁알만 줏으로 다녔더나. 퍼뜩 제 자리에 안 갖다 놓고 뭐하노."
"그냥 삶아 묵읍시더."
"저, 저 넘의 손이. 어디서 어른이 이야기로 하는데 함부로 말 대꾸로 하노? 핵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나. 그라고 말 못하는 날짐승이라꼬 함부로 대하는 기 아이다. 알것제?"
그랬다. 마을 어르신들은 계란은 삶아 먹어도 이상하게 꿩알은 삶아 먹지 않았다. 꿩알을 삶아 먹으면 그해 내내 재수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들이 꿩알을 주워오면 혼을 내며 도로 갖다 놓으라고 했다. 왜? 어느 해, 산수골에 사는 최산 집 아들이 꿩알을 삶아 먹은 뒤부터 그해 내내 우환이 뒤따랐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주워온 그 꿩알을 둥지에 다시 갖다 놓아도 까투리가 다시 찾아들지 않는 것이었다. 내가 소풀을 베러 들판에 나갈 때마다 다시 갖다 놓은 그 꿩알을 살펴보면 까투리가 다녀간 흔적이 없었다. 꿩알에 손을 대 보면 차가웠다. 처음 꿩알을 주웠을 때 느껴지던 그런 따스한 촉감이 없었다.
그리고 일주일 쯤 지나 이상하다 싶어 꿩알 하나를 깨뜨려 보았다. 이내 꿩알 속의 내용물이 추르륵 쏟아지면서 지독한 냄새가 났다. 꿩알이 그대로 썩어버린 것이었다. 그 뒤부터 나는 소풀을 베거나 산딸기를 따다가 간혹 꿩둥지를 발견해도 꿩알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마을 어르신들 말로는 사람 손이 한번 닿은 꿩알은 까투리가 다시는 찾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아나"
"옴마야! 이기 뭐꼬? 꽁새끼 아이가."
"니 줄라꼬 앞산가새에서 한 마리 잡았다 아이가."
"옴마야! 너무 귀엽다. 근데 이기 암꽁이가 수꽁이가?"
"그거는 내도 잘 모른다. 잘 키워보라모. 그기 암꽁인가 수꽁인가."
어떤 날, 보리밭에서 소풀을 베다 보면 어디선가 삐약, 삐약, 하는 병아리 우는 소리가 나기도 했다. 그때 병아리 우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보면 마악 부화한 꿩병아리들이 까투리를 따라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갓 부화한 꿩병아리들은 등에 까만 줄이 길게 그어져 있었다.
참개구리 만한 그 꿩병아리들은 앙증맞도록 귀여웠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 집에서 닭처럼 키우기 위해 꿩병아리를 몇 마리 잡아오기도 했다. 꿩병아리는 보기보다 동작이 몹시 빨랐다. 한 마리 잡으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어느새 어디로 숨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럴 때면 숨을 죽이고 가만히 앉아 기다려야만 했다.
그렇게 잠시 시간이 지나면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그 꿩병아리들이 다시 삐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말 그대로 솔개가 병아리를 채듯이 순식간에 덮쳐야 꿩병아리를 산 채로 사로잡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알에서 막 깨어난 꿩병아리도 꿩알과 마찬가지였다. 그 귀한 쌀을 모이로 주어도, 꿩병아리는 한 알도 찍어먹지 않고 밤새 삐약거리기만 했다. 그래서 나는 꿩병아리의 노란 부리를 벌려 하얀 쌀알 몇 점을 억지로 집어넣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게 2, 3일이 지나면 꿩병아리가 눈을 반쯤 감은 채 비실거리다가 그대로 죽어버리기 일쑤였다.
"쯧쯧쯧. 백지(쓸데없이) 멀쩡한 꽁새끼로 잡아오가꼬 그래 지기뿌나(죽이냐)? 그래. 갓난 애기가 에미 곁을 떠나서 우째 살 끼고."
"제가 지긴 기(죽인 게) 아입니더. 지가 모이로 묵기 싫어가 스스로 죽은 기지예."
"에라이 못 된 넘의 손아! 그 꽁새끼로 지 어마이 곁에 가만히 놔 두었으모 그리 죽었것나. 멀쩡한 꽁새끼로 지긴 기 울매나 큰 죄가 되는 줄 아직도 모르것나. 알라(아기)로 지긴 기나 꽁새끼로 지긴 기나 그기 그긴기라."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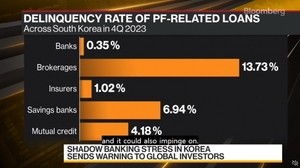






















![[특별대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유민주당 인천 서구병 이진기 예비후보](/news/photo/202403/600022_545770_3853.jpg)






![[긴급시국분석] 북한의 내년 4월 총선 전후 기습남침과 좌파들의 내란 및 전민봉기 철저히 대비하라!](/news/thumbnail/202312/592978_536686_4219_v150.jpg)